Premium Only Content

남회근, 주역 계사 강의, 공자, 역경, 군자의도, 어묵출처, 제갈량, 조조, 백모쟁탈전, 대과괘, 단사, 상사, 문언전, 잡괘전, 서괘전, 64괘, 복희씨, 문왕, 주공,위편삼절
"물이군분"은 다양한 종들이 각기 다른 사회를 이룬다는 것으로, 이로부터 "吉凶生矣", 길흉이 생겨납니다. 어떤 유의 인간이든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갖게 되면 곧 문제가 생깁니다. 의견이 달라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역경]을 읽고 난 뒤에는 천하의 어지러운 분쟁이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이군분으로 인해 이견이 생기며, 이견은 분쟁을 유발시키고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길흉이 생깁니다. 이렇게 본다면 길흉이란 종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를 형성한 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p.40)
[역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을까요? 변화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일이 없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사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시각각 모든 공간에서 변합니다. 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늘에는 천체의 현상이, 땅에는 구체적인 형질이 나타남으로써 그 사이에서 변화가 드러난다고 한 것입니다.
(p.41)
우주 만물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의 근원인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 보살이라 해도 좋고 알라신이라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좋습니다. 그것을 공자는 [역경]에서 '건(乾)'이라 했습니다. 건이란 우주 만물이 유래한 어떤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 에너지는 바로 "건지대시(乾知大始)"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에너지란 구체적 형태를 띤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발동하려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 '곤(坤)'이니까 곧 "坤作成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세계가 구성됩니다.
(p.51)
길흉이란 인위적인 가정으로서 인간의 마음이 이득과 손실에 대해 반응하는 일종의 심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吉凶者, 失得之象", 즉 길흉은 득실의 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략) 천지간에는 절대적인 길흉은 없으며 절대적인 옳고 그름도 없고 절대적인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이것은 형이상적 측면에서 하는 말입니다.(중략) 인간의 심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때는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길한 것만은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대단히 만족스럽겠지만 실의와 절망의 감정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좋겠지만 이별할 때는 무척 괴로울 것입니다.
(p.61~62)
천지인 삼극이 한 번 움직이면 곧 육효가 됩니다. (중략) 구심력이 있으면 원심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역경]을 읽고 나면 저는 매우 두려워집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충심으로 대하고 우리 또한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는 충심도 소용없습니다. 구심력이 있으면 원심력도 있으니까요. 저는 늘 말하곤 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도 믿기 어려운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은 변합니다. 인문 사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p.68)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사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각자가 자기 몫을 챙기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사뿐 아니라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들어온 신입사원은 자기를 채용해 준 데 대해 몹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지나면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제기랄, 회사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시피 했는데 이따위 대우가 말이나 돼!"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단계들입니다.
(p.193)
좋은 사람도 어떤 때는 아주 나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나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어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 바꾸어 보려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나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곤란하지요. 이 때문에 옛사람들은 차라리 소인은 쓸 수 있어도 군자인 척하는 자는 쓰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군자인 척하는 자보다는 소인이 오히려 다루기가 쉽지요.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것은 어린애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얼른 판별해 내듯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의 말과 행위 속에서 판별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p.195)
접기
출판사 서평
동양학의 최고수 남회근, 주역 계사전을 말하다
계사전은 상하 12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과 땅의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인생 문제를 설명하며 그것을 정치사상적 철학으로, 또 처세의 학문으로 확장시키는 계사전은 역경을 읽기 전에 먼저 읽으면 그 체계를 잡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입문서이자 지침서이다.
이런 계사전을 강의하는 남회근 선생의 관점은 철저히 전통적 견해에 입각해 있다.
먼저 계사전 저자에 대한 선생의 견해가 그렇다. 선생은 계사전을 공자의 저작이라 전제한다. 나이 오십에 역경을 공부하여 위편삼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역에 심취한 공자가 역경을 연구하여 체득한 바를 밝힌 보고서라는 것이다. 계사전이 공자 저작이라는 근거는 그 문장이다. 선생은 공자 외에 이만큼 격조 있고 빼어난 문장을 쓰기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 학계가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계사전이 공자의 저작이 아니라 공자 계열의 학자들이 지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역자는 계사전 저자에 대한 논란과 학계의 정설을 인정하나, "누구의 저작이든 논조가 품격 있고 견실한 것만은 틀림없다. 또 참고서라고는 해도 기원전의 작품이니 그것 자체가 이미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하며 계사전 저자에 대한 논란이나 남회근 선생의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뒤로 하고 텍스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남회근 선생은 공자가 해석한 계사전을 꿰뚫어야 역경의 상수를 연구하기 위한 핵심을 손에 쥘 수 있고, 그런 후에야 동양 문화의 근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해되어야 공자 사상과 유가 학설의 근원을 탐구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선생은 공자가 지었다고 믿는 계사전에 유학의 뿌리, 동양문화의 근원이 담겨 있다고 본 것이다.
무엇을 주역이라 하는가
오경五經을 말할 때는 역경이라 부르는데 왜 일반적으로 주역이라 할까.
통상 주역이라 부르는 것은 역경易經과 역전易傳을 합한 이름이다. 역경은 64괘 괘상과 64괘에 달린 괘사, 64괘 아래 각각 6개씩 있는 효에 붙은 효사를 말한다. 역전은 역경을 해설하기 위해 덧붙여진 설명문으로 단사, 상사, 문언전, 잡괘전, 서괘전, 계사전 등을 일컫는다.
원래 역경과 역전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후대에 통합되어 주역이란 책이 되었다. 단사나 상사, 문언 등은 역경 중간중간에 들어 있으나 계사전은 총론격인 글의 성격상 맨 앞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경전을 해설하는 전傳이 경經 앞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여 뒤에 붙었다고 한다.
역경과 역전은 지은이도 다르고 만들어진 시기도 다르다. 지은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다. 역경의 기본을 이루는 8괘는 상고시대 복희씨가 도안했고, 64괘와 괘사는 주나라 문왕이, 384효의 효사는 문왕의 아들 주공이 지었다. 역전은 공자의 저작이라는 게 예전의 견해였다가 요즘은 공자 계열의 학자들이 지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역경과 역전은 생성 시기도 다르다. 역경은 기원전 11-12세기 무렵의 것이고, 계사전을 포함한 역전은 공자가 지었으면 기원전 5세기의 작품이고 공자 계열의 학자들이 저자라면 그보다 몇 백 년 후의 것이다.
역경과 역전은 역할도 차이가 있다. 역경은 자연 현상을 여덟 가지-하늘天, 땅地, 물坎, 불離, 바람巽, 못兌, 산艮, 천둥震-로 대표하여 8상을 만들고 그것을 중첩시켜 64괘로 범주화하여 인간의 물음에 길흉을 점치도록 만든 것이다. 반면 역전은 후대인들이 역경을 공부하고 나서 법칙을 세우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연역적인 기록의 결과들로, 괘에 대한 설명, 배열 순서, 철학적 해석 등을 밝힌 것이다.
후인들이 덧붙인 이런 해설서들이 역경 본래의 뜻을 왜곡하여 역을 신비화하거나 복잡하고 현학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도 많다. 하지만 계사전을 포함해 역전의 글이 없었다면 역이 후대에 전해지지 못했으리라는 주장이 있을 만큼 역전은 역경의 사상과 이용 원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담고 있어 주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더욱이 역경에서 찾은 유교의 근본은 이후 중국을 비롯해 동양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子曰, 祐者助也, 天之所助者順也." 이것이 바로 공자의 종교 철학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의 가호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자는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부처나 신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 꿇어앉아 절을 한다고 도와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해 줄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가호를 비니 하나님인들 오죽 바쁘겠습니까? 한 장소에서 재판을 하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인들 어떡하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은 보살이나 신에게 빌면서 돈은 쥐꼬리만큼 내고 바라기는 엄청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삼천 원쯤 들여 바나나나 초를 사서 상을 차려 놓고 부자가 되도록 해 달라, 승진이 되도록 해 달라, 무사하도록 해 달라며 별의별 것을 다 원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p.358)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남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미신이 아닙니다. 신을 믿고 하나님을 받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 돕는 것은 순리이며, 사람이 돕는 것은 신의라고 한 것입니다. 신의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도와줍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사람도 이러한데 부처님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p.358)
-
 LIVE
LIVE
SpartanTheDogg
6 hours agoPro Halo Player
149 watching -
 LIVE
LIVE
Crossplay Gaming!
1 hour agoLet's Check Out MORE Metroid Prime Remastered in 4K! (With the RTX 5090!)
98 watching -
 14:24
14:24
AlaskanBallistics
10 hours agoMDT HNT26 Chassis on A Remington 700 7mm Remington Magnum
1.24K5 -
 54:13
54:13
Sarah Westall
4 hours agoCIA Disclosures: Ark of the Convenient, the Pyramid Code, Ley Lines & Earth’s Energy w/ Jason Shurka
19.7K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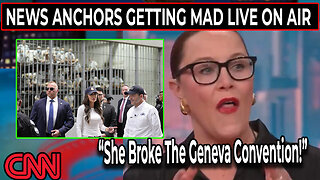 13:34
13:34
T-SPLY
6 hours agoCNN Is Now Accusing Trump Staff Of War Crimes
22.2K18 -
 1:33:25
1:33:25
2 MIKES LIVE
6 hours ago2 MIKES LIVE #199 Deep Dive Monday!
17.2K4 -
 54:40
54:40
LFA TV
9 hours agoThe World Realigns Against America | TRUMPET DAILY 3.31.25 7PM
19.5K11 -
 1:42:08
1:42:08
Redacted News
5 hours agoThis is getting out of hand! Dems firebomb GOP headquarters
114K2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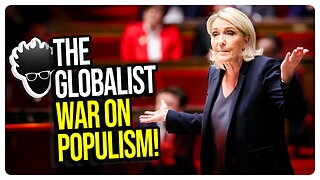 1:26:10
1:26:10
vivafrei
7 hours agoMarie Le Pen DISQUALIFIED from Elections! It's a GLOBALIST WAR ON POPULISM! & MORE! Viva Frei
125K94 -
 26:20
26:20
Nick Shirley
7 hours ago $1.01 earnedInside Ireland’s Dangerous Migrant Crisis
16.1K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