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Only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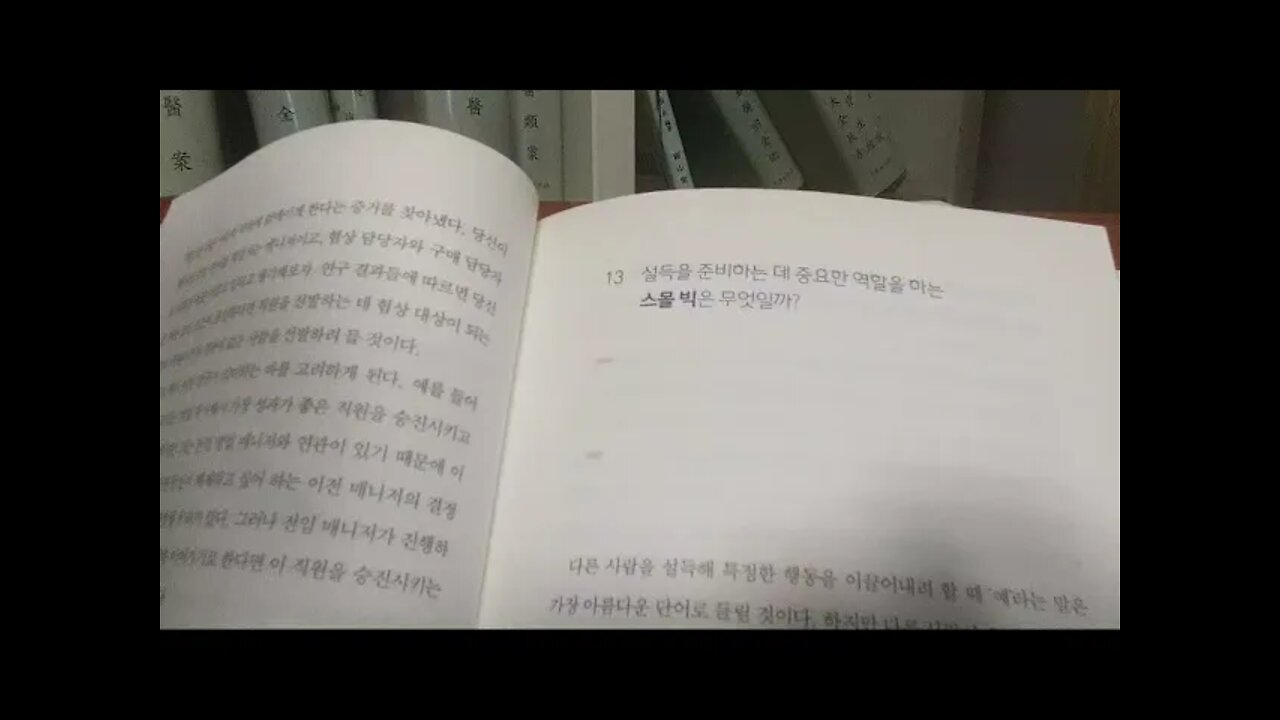
설득의 심리학3, 로버트 치알디니, 스몰 빅,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려할때, 선거후, 투표, 기본형 원고,전략, 멍때리는 습관, 자기 합리화, 소일거리, 틀린그림찾기, 보육원, 고아
툭하면 ‘멍~때리는’ 습관은 분명 내 잘못이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근거를 들어 자기 합리화를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멍~때리는’ 시간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헤리엇와트대학교(Heriot-Watt University) 듀어(Dewar)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얼마 전 발표한 논문을 방패로 삼아 잠깐 자기 변론을 펼쳐보려 한다.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 70명에게 단어를 암기하라는 과제를 내주었다. 그들은 모니터에 ‘햇빛’, ‘역’, ‘전문가’ 등 일상에 서 사용하는 단어 15개를 표시했다. 표시 시간은 각 단어 당 1초. 15분 후 그중 몇 개의 단어를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연구팀은 참여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자 다른 방식으로 15분을 보내게 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방안의 불을 끄고 휴대전화와 신문, 잡지 등 소일거리를 모두 금지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특정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했다. 두 번째 그룹 참여자들은 연구팀이 미리 준비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며 15분을 보냈다. 결과는 놀라웠다. 멍하니 시간을 보낸 그룹은 평균 70퍼센트 수준으로 단어를 기억한 반면, 특정 작업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낸 그룹은 평균 55퍼센트 이하의 정답률을 보였다. 일주일 뒤 다시 암기한 단어를 확인하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멍하니 시간을 보낸 그룹은 여전히 50퍼센트 수준의 단어를 기억했지만, 특정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낸 그룹의 정답률은 30퍼센트를 밑돌았다. 즉, ‘멍하니 있는 시간’은 게으름을 피우며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직전에 습득한 정보를 확실한 기억으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두뇌 활동 시간’인 셈이다.
― 본문 중에서 (123~124p.)
이후 좀 더 신빙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일이었다. 전쟁에서는 수많은 고아가 생겨난다. 정신과 전문의 르네 스피츠(Rene Spitz) 박사는 보육원에서 본격 연구에 착수했다. 치밀한 조사 끝에, 그는 보육원의 영·유아 91명 중 35명의 아이가 만 2세가 되기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에 스피츠 박사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당시에는 이미 영양과 위생이 건강한 신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 보육원도 부족하나마 아이들에게 충분한 식사와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분명 영양 부족이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보육원에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니었다. 유일하게 부족한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이었다.
보육원에는 수많은 아동이 모여 살았지만,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모든 아이에게 골고루 돌봄의 손길을 주지는 못했다. 선생님들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결국, 스피츠 박사는 ‘소통 결여’를 사망 원인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 본문 중에서 (170~171p.)
사람은 생후 2개월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어머니와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어머니라는 불변의 ‘동일성’을 깨닫는다. 4개월 차에 접어들면 실제 얼굴과 사진의 얼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한 돌 반 이 되면 사진과 거울 속의 자신을 ‘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경지인 ‘동일성’ 이해다.
프랑스 국립 과학연구소(CNRS)의 파고(J. Fagot) 박사 연구팀은 고릴라가 사진 속 바나나를 진짜 바나나로 착각해 바나나 사진을 우걱우걱 먹어치우는 상황을 보고했다. 고릴라는 사진과 실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고릴라는 ‘사진’이라는 인류가 만들어낸 산물을 처음으로 경험한 터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릴라도 훈련하면 실물과 사진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곤충인 꿀벌조차 ‘동일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꿀벌에게 노란색과 초록색 패널을 보여주고, 미로 안쪽에 2장의 패널에 영사된 색을 선택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직전에 본 패널과 같은 색을 선택하면 설탕물이 나오는 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면 꿀벌은 같은 색 패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훈련을 거친 꿀벌은 이어서 색이 아니라 가로줄무늬 또는 세로줄무늬라는 흑백무늬를 선택하는 실험에 난데없이 투입된다. 그런데 훈련된 꿀벌은 처음 본 무늬에도 당황하지 않고 같은 무늬를 선택한다. 즉, ‘동일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꿀벌이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205~206p.)
얼굴 한가운데 좌우 시야를 가로막는 벽을 세우고, 오른쪽 눈에 초록색을, 왼쪽 눈에 빨간색을 보여주면 ‘노란색’이 나타난다. 빨강과 초록이 뇌에서 섞여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노란색’이 눈앞에 나타나는 셈이다. 이 실험으로 뇌가 보고 있는 대상은 색깔이 아니라 신경 신호를 ‘해석’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3원색’은 동물계에서는 특수한 사례다. 개와 소 등 많은 포유류가 보는 세상은 주황색과 파란색의 2원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반면, 조류와 곤충은 대개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조류와 곤충이 보는 세상은 4원색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초기 동물들은 4가지 색채 센서를 활용해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진화 과정에서 차츰 색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2원색으로 줄어들었다. 당시 대다수 포유류는 야행성이었기에 2원색만으로도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 이후 일부 포유류가 주행성으로 변하는 과정에 2원색 중 주황색 센서가 2개로 분리되면서 초록색과 빨간색 센서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3원색의 기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은 자외선을 보지 못한다. 그런 터라, 벌레나 새의 시각 세계를 알 길이 없다. 자외선 카메라로 촬영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거에 본 적도 없는 선명한 색채로 가득 차 있어 눈을 비비며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풍경을 의심하게 된다. 아니, 알고 보면 사실 이는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
 30:07
30:07
Degenerate Plays
14 hours agoI See London, I See France, I See Suzie's... - Marvel Rivals: Part 2
541 -
 17:17
17:17
RealReaper
15 hours ago $0.03 earnedSnow White Is Worse Than AIDS
1143 -
 1:39
1:39
Gun Drummer
20 hours agoSlipknot - TANK COVER
352 -
 2:10:11
2:10:11
Badlands Media
1 day agoDevolution Power Hour Ep. 340
145K81 -
 47:21
47:21
Stephen Gardner
12 hours ago🔥The DEEP STATE is still covering up this HUGE LIE!! Trump MUST release MORE!!
39.9K104 -
 2:36:13
2:36:13
TimcastIRL
11 hours agoTrump Announces 25% Tariff On ALL CARS, Canada Begins MASS LAYOFFS Over Tariffs | Timcast IRL
312K204 -
 4:03:55
4:03:55
Alex Zedra
10 hours agoLIVE! New Game | Lost Lullabies
41.9K2 -
 2:44:05
2:44:05
TheSaltyCracker
11 hours agoDeep State Set Up Trump ReeEEStream Stream 03-26-25
173K347 -
 31:34
31:34
Friday Beers
17 hours ago $4.23 earnedWe Drank 12 Beers and Solved the Case of 9 Dead Hikers
54K13 -
 18:11
18:11
Nick Shirley
12 hours ago $10.26 earnedAsking The Irish If They Will Vote for Conor McGregor 🇮🇪
77.5K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