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Only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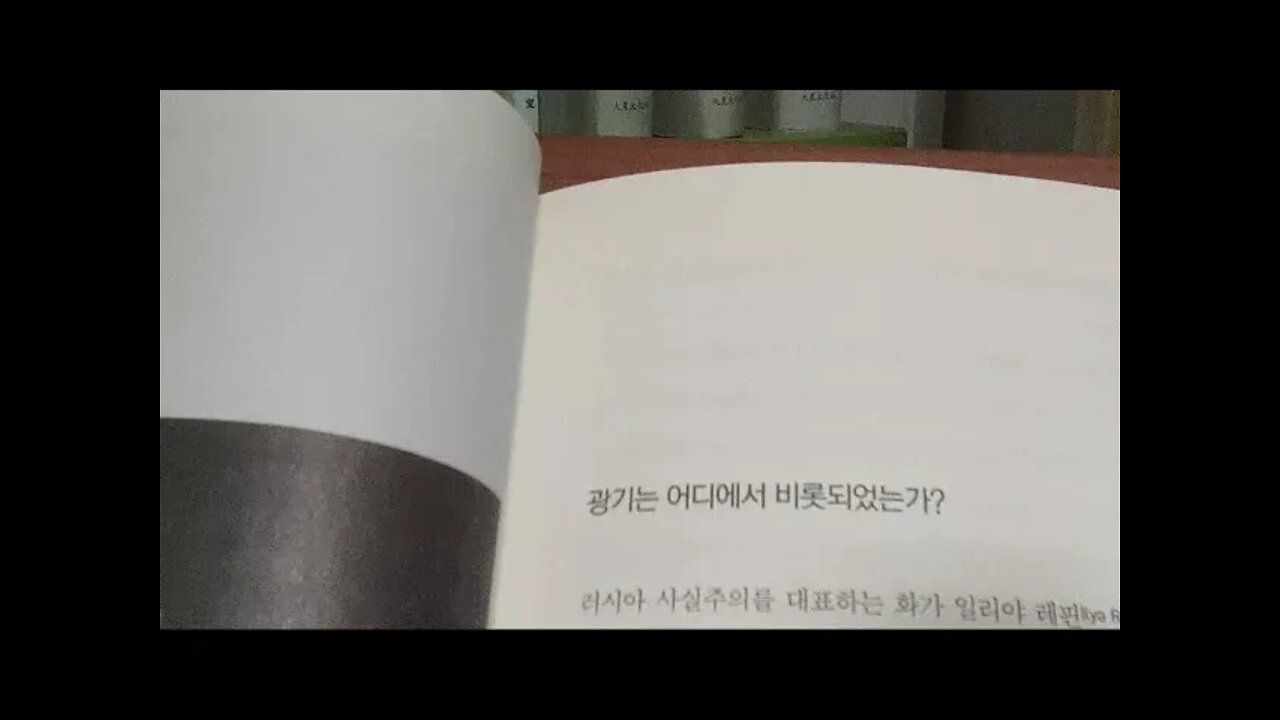
미술관에서 만난 심리학, 박홍순, 광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일리야레핀, 사실주의, 이반4세, 퓌슬리, 침묵, 카프카, 변신,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 볼핀치, 그리스로마 신화
저자 박홍순은 동서양의 고전을 친근한 벗으로 만들고 고전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책을 저술하는 데 애착을 갖고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예술적 상상력과 인문적 ... 더보기
목차
저자의 말
미술과 문학으로 심리학을 만나다 05
1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1장 의식으로 사는가, 무의식으로 사는가? 15
퓌슬리 〈침묵〉, 카프카 《변신》,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무의식의 힘 / 의식과 이성만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주장 /
무의식이 마음의 주인이다
2장 무의식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47
피츠제럴드〈꿈의 재료〉,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로이트 《자아와 이드》
무의식을 찾아 떠나는 프루스트의 길/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면 무의식이 보인다/ 마음의 구조를 찾아서
3장 무의식은 개인적인가, 사회적인가? 75
레핀〈이반뇌제와 아들〉, 볼핀치 《그리스로마 신화》, 아들러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광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 성적인 요인의 나르시시즘 / 개인심리학의 관점 / 나르시시즘을 권하는 사회
4장 심리학은 관념인가, 과학인가? 109
뵈클린〈바다의 별장〉, 최인훈 《구운몽》, 스티븐 핑커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심리현상의 분석 기준은 있는가? / 신화 해석의 다양성 / 꿈을 통한 무의식 일반화 /
진화이론을 통한 무의식 이해
2부 무의식이 개인의 마음을 흔들다
1장 인간은 왜 불안한가? 141
뭉크〈불안〉, 사르트르 《자유의 길》, 프리츠 리만 《불안의 심리》
인간은 불안한 존재/ 분리와 고립에서 오는 불안/ 죽음과 불안/ 세상에 내던져진 불안/
불안, 어찌할 것인가?
2장 무엇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가? 179
고흐〈귀를 붕대로 감은 자화상〉, 보들레르 《파리의 우울》, 크리스토퍼 레인 《만들어진 우울증》
우울증을 짊어지고 산 고흐/ 우울증은 왜 생기는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 만들어진 우울증
3장 열등감과 우월감은 왜 생기는가? 215
렘브란트〈사울과 다윗〉, 루쉰 《아Q정전》, 아들러 《삶의 과학》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다/ 열등감, 우월감의 정체/ 피그말리온 효과/ 사회적으로 조장된 감정/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4장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249
티치아노〈아담과 이브〉, 몰리에르 《타르튀프》, 하틀리 《거짓말의 비밀》
거짓말로 시작된 인류?/ 거짓말은 자기애의 한 형태/ 우리는 모두 비밀이 있다/ 자기 거짓말을 믿다
5장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른가? 279
에이크〈아르놀피니 부부〉, 셰익스피어 《햄릿》, 프란츠 《개성화 과정》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성기 차이와 성격 차이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
3부 심리가 사회적 행동을 조종하다
1장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309
제리코〈도벽환자〉,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게일 살츠 《비밀스런 삶의 해부》
범죄와 악의 정당화/ 왜 악한 행위를 하는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범죄와 ‘깨진 창문 이론’
2장 우리는 왜 지배하고 복종하는가? 335
호머〈허리케인 이후〉, 고골 《외투》,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지배하고 복종하는 인간/ 권력 욕구와 복종 욕구/ 악의 평범성과 복종/ 전쟁을 통한 지배와 복종의 강화
3장 다중인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363
키르히너〈밤거리 풍경〉, 스티븐슨 《지킬박사와 하이드》, 리타 카터 《다중인격의 심리학》
여러 개의 인격으로 살다/ 단일한 인격이라는 신화/ 분열된 자아로 사는 인간/ 다중인격을 권하는 현대사회
참고문헌 389
책 속으로
현재의 시간과 장소를 시각과 촉각 등 감각을 통해 확인해보려고 하지만 실마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기억은 의식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몸이 그 방을 기억해낸다. 퓌슬리의 〈침묵〉에서도 떨어뜨린 고개와 함께 말이 사라졌지만 몸이 그녀의 상태를 기억하고 전달해준다. 정신이 아니라 몸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열쇠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18~19쪽)
에른스트의 〈인간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리라〉는 본능과 무의식에 조종당하는 현실을 담아냈다. 대지에는 신체 장기 모양의 것들이 펼쳐져 있고, 위로는 큼지막한 달이 걸려 있다. 달 아래로 남녀의 섹스 장면이 나온다. 중간에 손이 있고 이 모든 장치가 여러 개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달은 이성 중심의 낮에 대비되는, 본능과 감정이 충만한 밤의 세계를 상징한다. 섹스와 장기도 성적 충동과 근원적 욕구를 의미한다. 이 모두를 관통하는 끈이 보여주듯이 성적 본능과 욕구에 근거한 무의식이 사고와 행동을 조종하는 숨겨진 힘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38~40쪽)
이반 4세의 광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처형 장면을 보며 희열을 느끼고, 옷차림 하나 때문에 살기를 품고 며느리에게 쇠 지팡이를 휘두르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직접 때려죽인 행위는 이른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심리의 밑바닥에 무엇이 꿈틀거렸기에 광기를 분출했을까? 순수하게 개인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인가? (78쪽)
정신활동은 무의식에서 전의식을 거쳐 의식으로 나아가는데, 무의식은 주로 소원 성취에 작용한다. 전의식은 검열 기능에 작용한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의식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갖지만, 전의식이 통로를 병풍처럼 가로막고 검열하기 때문에 소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 비유나 상징 형식으로 굴절되고 왜곡된다. 그러므로 심리학은 순수한 의미의 꿈 자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전의식의 압박이 꿈의 줄거리와 상징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반영’이 아닌 ‘형성’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형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128쪽)
고흐의 〈성경과 삶의 기쁨〉은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경향을 분석하는 그림으로 자주 거론된다. 큰 판형으로 제작된 《성경》과 촛대가 있고, 그 앞에 에밀 졸라의 소설 《삶의 기쁨》이 있다. 그런데 그림에 등장하는 두 권의 책은 단순한 정물 소재를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그림을 제작하기 몇 년 전부터 고흐는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191쪽)
열등감은 현대 심리학의 주요 관심사다. 아들러에 따르면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인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심리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아들러는 다양한 저작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룬다. (225쪽)
렘브란트의 〈마지막 자화상〉은 63세로 생애를 마치던 해에 그려진 자화상이다. 앞에서 본 젊은 시절이나 중년기의 자화상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20~30대의 자화상에서는 세상 거칠 것 없다는 우월감이, 명성과 부를 잃고 초라한 생활을 하던 50대의 자화상에서는 우월감으로 가장한 열등감이 보인다. 하지만 마지막 자화상에서는 이렇다 할 표정을 읽어내기 어렵다. (243~244쪽)
-
 LIVE
LIVE
Badlands Media
7 hours agoBadlands Daily – Nov. 27, 2025
9,597 watching -
 LIVE
LIVE
FusedAegisTV
1 hour agoFUSEDAEGIS | They Put A Freakin' Blue Mage In THIS | Expedition 33 PART V
100 watching -
 LIVE
LIVE
Wendy Bell Radio
6 hours agoPoint Blank Hate
6,068 watching -
 LIVE
LIVE
MrR4ger
4 hours agoWARLOCK SOLO SELF FOUND HARDCORE - D4RK AND D4RKER HAPPY TURKEY DAY RUMBLEFAM
101 watching -
 1:33:31
1:33:31
Barry Cunningham
11 hours agoBREAKING NEWS: KASH PATEL AND DOJ HOLD PRESS CONFERENCE UPDATE ON NATIONAL GUARD ATTACK
70.8K27 -
 1:22:22
1:22:22
iCkEdMeL
2 hours ago $4.76 earned🔴 BOMBSHELL: DC Shooter Worked With CIA-Backed Unit in Afghanistan, Officials Say
3.3K1 -
 17:28
17:28
Tactical Advisor
1 day agoComparing the NEW Cloud Defensive EPL
69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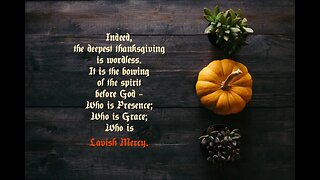 LIVE
LIVE
freecastle
10 hours agoTAKE UP YOUR CROSS- THANKSGIVING MUSIC EXTRAVAGANZA!
79 watching -
 57:54
57:54
A Cigar Hustlers Podcast Every Day
6 hours agoCigar Hustlers Podcast Evere Week Day w/Steve Saka
81 -
 1:09:06
1:09:06
Mike Mac - Say Something
16 hours agoSAY SOMETHING w/ MIKE MAC
41